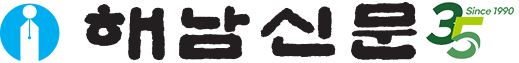천정술 (김대중재단 전남지부 부회장)

고인돌은 왜 만들었을까? 선사시대에는 모든 건축행위가 인력으로 이뤄졌다. 이런 고인돌을 건축하려면 절대적으로 말 잘 듣는 백명 정도의 사람을 수개월 동안 동원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고인돌을 왜 지었을까? 답은 권력의 과시다. 거석문화는 권력의 상징이다. 더 무거운 건축물일수록 더 큰 권력을 나타낸다. 고인돌을 지나 영국의 스톤핸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등이 좋은 예이다. 정복자는 제국을 유지하고 통치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항상 상징적인 건축물을 건축했다.
그러나 지나친 건축은 제국에게 독이 되었다. 진시황제도 만리장성을 세웠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나라는 일찍 멸망했다. 남태평양 이스터섬의 거대한 얼굴 모양의 모아이 석상을 만든 문명도 일찍 망했다. 이스터섬 사람들은 과시를 위해 석상을 만들었는데 경쟁이 과해져 삼림을 모두 없애며 석상을 만들었고 고기잡이 카누를 만들기 위한 나무마저 부족해져 이들 부족이 망했다. 이처럼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건축은 문명도 망하게 한다.
우리 조선 말기에도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시작한 경복궁 중건은 막대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해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원하여 스스로 납부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관리들에게 직급에 따라 반강제로 금액이 할당되었고 백성들은 납부하는 액수에 따라 벼슬과 상을 주었다. 이걸로도 부족해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동원한 것은 물론 문세와 결두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주조하여 국가 경제의 혼란을 초래해 민심이반을 가져와 흥선대원군의 실각을 앞당겼다.
현시대의 모아이석상, 경복궁은 무엇일까? 쓸데없이 딱히 수요도 없는데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부르즈 할리파를 건축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불필요한 건축물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사회적 불균형이 생겨 조직이 붕괴한다. 예전의 거대건축물은 권력의 과시였으나 과도한 건축물은 사회적 부가 낭비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여 경제 전체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 통상 건축물이 지어지면 건축물이 철거 소멸될 때까지 초기 건축비의 여섯배 정도의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건축물은 수요예측기능에 맞는 공간구성 적절한 도시구성을 위한 건물위치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등은 호화청사로 사회적비판을 받았으며 성남시는 과도한부채로 인하여 이재명대통령이 시장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청산하기도 했다.
대형건축공사는 사전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정책결정자들의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불필요한 건축물로 인해 국가 예산과 사회적 부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이상 건설사업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