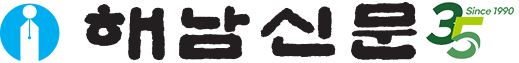정주아
환경교육기획자

요즘 날씨를 보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실히 느낀다. 아침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오후에는 숨이 막힐 듯한 폭염이 찾아오고 밤이면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날이 반복된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록적인 폭우’, ‘역대 최고 기온’이라는 말이 쏟아진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예고가 아니다. 이미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재난이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의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일상 속 선택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고 유행이 지나면 몇 번 입지 않은 채 버린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는 매년 약 9200만 톤의 의류가 버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소각돼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의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3㎏의 옷을 버리고 전국적으로는 20만 톤이 넘는 폐의류가 발생한다.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며 탄소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헌 옷 수거함에 버리는 옷들도 마찬가지다. 버리는 사람은 ‘기부’나 ‘재활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내에서 수거된 헌 옷의 상당량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데 이미 과잉 공급된 의류로 인해 현지에서는 처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절반 이상은 다시 쓰레기가 돼 매립되거나 강가에 방치되며 현지 생태계와 공공 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손쉽게 버린 옷 한 벌이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쓰레기 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썩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아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값싼 옷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세계 곳곳의 취약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알고 난 뒤 나는 올해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올해 새 옷을 사지 않겠다’고 처음엔 단순한 마음이었다. 넘쳐나는 옷장을 정리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실천을 이어가면서 이 다짐은 점점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옷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원을 아끼는 일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자, 누군가의 노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선택이기도 했다.
상반기에 나는 이 다짐을 글로도 나눴고 지금 7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새 옷을 한 벌도 사지 않고 있다. 물론 유혹은 있었다.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매장 앞에 예쁜 옷이 진열되면 나도 흔들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약속을 했는가’를 다시 떠올렸다. 그러자 선택은 다시 단단해졌다. 나는 입던 옷을 돌려 입고 친구들과 나누고 때로는 수선해서 다시 입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옷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내 실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친구는 입지 않는 옷을 함께 나누자고 했고 지인들은 중고 의류를 이용해 보고 싶다고 했다. 같이 바느질을 하며 수선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직접 수선한 옷에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됐다. 작은 실천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든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덜 사고 오래 입고 다시 나누는 것. 옷을 사기 전 한 번 더 고민하고 입지 않는 옷은 나누고 수선해서 새 옷처럼 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에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나는 올해 옷을 사지 않음으로써 나의 신념을 실천하고 있고 이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옷 한 벌 덜 사는 일, 그것이 지구를 식히는 작고 확실한 행동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