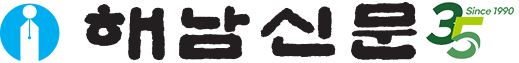- 닉네임
- 다산제추진위
자유게시판
- 제목
-
다산제초청강연 : 8일 - 박석무, 9일 - 이태호
8일(10:30-12시, 강진 도암 다산수련원 다목적실)에는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과 강진의 르네상스'를 주제로 박석무 한국고전번역원장(다산학)이 강연합니다.
8일(10:30-12시, 강진 도암 다산수련원 다목적실)에는 '다산 정약용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태호 명지대 교수(한국미술사)가 강연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과 강진의 르네상스’ (박석무)
(2010, 5. 8(토) 10:30 - 12:00 다산수련원 다목적실)
===> ‘강진지역과 다산 정약용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될 이 강연은 강진에 귀양 와 살았던 다산 정약용의 학문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당시 강진의 여러 지역적 환경과 사례들에 대한 강의다. 다산 정약용의 학문은 그의 독창성과 시대환경 등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그의 학문적 배경이 되었던 유배지 강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물심양면의 도움이다. 특히 ‘다신계’ 계원들을 비롯해 다산과 함께 경향을 오르내리며 당대의 학문과 문화를 꽃피웠던 제자들의 활동은 가히 ‘르네상스’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번 강연은 이에 대한 풍성하고도 폭넓은 이해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박석무
1942년 전남 무안에서 대대로 한학을 해온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전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했다.(법학석사) 대학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에 깊이 간여하였고, 교사로 부임해 광주 대동고에서 재직하던 무렵 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해직되었다. 뒤로 그는 ‘한중고문연구소’를 열어서 한학을 기반으로 한 인문-사회학 등 여러 형태의 연구활동을 했다. 이 시기 전남대(철학과)에 재직하고 있었던 다산 연구가 이을호 박사 등의 도움에 힘입어 다산 정약용에 대해 깊이 공부했다. 그 결과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창작과비평사), [애절양](시인사) 등이다.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공동의장(1987), 13-14대 국회의원(무안)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회활동시 주로 문공위에서 활동했고,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원으로 알려졌다. 또 의정활동중에서도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저서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 기행],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 [다산 정약용의 일일수행] 등이 있다.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1997),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1998), 민족문화추진회 이사(1998), 5.18기념재단 이사장(2006), 단국대학교 이사장(2005-7) 등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해왔고,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2004∼), 한국고전번역원장(2007∼)이다. q
‘다산 정약용의 예술세계’ (이태호)
(2010, 5. 9(일) 10:30-12:00 다산수련원 다목적실)
===>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학자로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넓은 학문적 폭과 넓이, 안목 못지 않게 ‘시서화 삼절’로 불리우는 예술 방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남겼다. 전해 내려오는 수없이 많은 그의 저작들에 나타나는 서법, ‘애절양’, ‘용산마을의 아전’ 등 강진에서 지은 것들을 비롯한 여러 시편들, 그리 많지는 않지만 현전하는 수묵그림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적 관점을 드러내는 데에서도 비범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술에 대한 여러 언급들과 저작들에 나타나는 시선들이 그것이다. 강의는 접하기 쉬운 슬라이드를 보며 이런 그의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연히 드러내줄 것이다.
이태호
1952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그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사(문학사)를 공부했다. 졸업 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장미술품들을 가까이서 접하고 연구하며 한국미술사, 특히 조선후기 미술사(회화사)에 대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이어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근무했고, 뒤로 전남대학교에서도 한국미술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 시기 그는 5.18광주민중항쟁 이후의 시대적 분위기를 예술활동을 통해 계승하려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이론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지금은 명지대학교 미술학과(한국미술사) 교수다.
그는 ‘조선후기 진경산수화’ 분야의 독보적인 연구자로,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등의 그림들에 대한 폭넓은 접근으로 학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2008년 강진군에서 다산 정약용 표준영정을 제작할 때, 그림을 그렸던 김호석(한국전통예술학교 교수)의 자문역을 맡았다.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윤용이, 유홍준과 공저, 학고재, 1997), [조선 미술사 기행 - 금강산, 천년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다른세상, 1999), [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 (조선 후기 초상화와 카메라 옵스쿠라)](생각의나무 2008), [문자도](대원사, 1998),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여성신문사, 1998)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 이전글 바로가기
- ◆◆ 5월 kt쿡,엘지파워콤,브로드밴드 현금최고지급
- 다음글 바로가기
-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